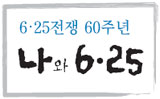②'캐나다 병사' 코트니氏의 참전기
"자유세계 수호하겠다" 의지, 보상 없었지만 열심히 싸워
우리 부대엔 한국짐꾼 많아… 그들이 우리 시신 묻어줘…
매년 2차대전 종전일엔 전우들 모여 부산향해 참배
6·25전쟁에서 돌아온 1953년, 난 19살이었다. 대학 진학을 준비했지만 공부에 전념할 수 없었다. 전장(戰場)의 또렷한 장면들이 되살아 올 때면 나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럴 땐 독한 술을 찾았다. 취해 울기도 하고 분노에 떨기도 했다. 1950년대를 그렇게 보냈다. 술은 전쟁 때 참호에서 긴장과 공포를 떨치기 위해 처음 배웠다.죽을 고비를 넘기며 돌아왔지만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었다. 중요한 일을 했다고 자부했지만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우리 참전용사들도 참전 때의 확신이 흔들렸다. 한국은 여전히 분단국가였고, 북한은 강압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잘 모르는 나라를 위해 싸우겠노라며 이름을 적은 일이 바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6·25전쟁 참전에 자원
60년 전쯤엔 캐나다에서도 형편 좋은 집 자녀들만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난 중학교를 졸업하고 1950년 16살에 군인이 됐고, 2년후 6·25전쟁 지원자 모집광고를 보고 주저 없이 이름을 써냈다. 경쟁률이 엄청났다. 목숨을 내놔야 하는 전쟁에 왜 그토록들 끌렸는지 지금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땐 그랬다. 2차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언론은 늘 냉전(冷戰)의 위협을 보도했다. 젊은이들 사이에 자유세계를 수호해야 한다는 의지가 넘쳤다. 참전에 따른 별도의 금전적 보상은 없었다.
내 경우는 더욱 절실했다. 아버지는 1차대전 참전 상이용사였고, 우리 가족은 영국에 잠시 사는 동안 2차대전을 맞아 독일군 공습을 경험했다. 캐나다에 돌아와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늘 반공(反共) 교육을 받았다.

- ▲ 빈스 코트니씨가 1952년 가을 임진강 상류 인근 들판에 있는 석상 옆에서 찍은 사진. 그는“웃고 있지만 중공군 부대와 3일 내내 밤잠을 못 자고 싸웠던 직후”라고 설명했다. / 코트니씨 제공
◆죽음 앞에서
1952년 9월 캐나다 보병 3연대 소속 일등병으로 일본을 거쳐 부산항에 닿았다. 1930년대에 나온 내셔널지오그래픽의 한국 특집편을 보고 아름다운 자연에 깊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어, 이 나라 이름은 익숙했다. 낡아빠진 부두에 다가가자 가슴이 쿵쿵 뛰며 흥분되기 시작했다.
경기도 임진강 전선(戰線)에 배치됐다. 이른바 '갈고리(Hook) 고지'를 놓고 중공군과 유엔군이 격전을 벌였다. 우리는 미군·영국군과 함께 싸웠다.
이틀째 되는 날. 한쪽 눈과 한쪽 손이 몸에 붙어 있지 않은 시신, 사지(四肢)를 모두 잃은 토르소(torso) 모양의 발가벗은 시신을 목격했다. 발밑에 채인 영국군 시신은 머리가 없었는데, 누군가 머리가 잘린 부분을 가려주려고 외투를 당겨놓았다. 죽음을 부르는 교전은 거의 매일 벌어졌다.
그해 11월 꽤 추운 날로 기억한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중공군 몇 명이 다가왔다. 그들은 새들처럼 달콤한 멜로디의 노래를 불렀다. 관심을 흩트려놓을 심산이었던 것이다. 적들이 우리 진지에 거의 다가왔다고 느끼는 순간, 코앞에 다가온 적들의 총이 불을 뿜었다. 나는 동료 둘과 함께 정신없이 앞으로 기었다. 낮은 자세로 전진하며 75개 탄알이 든 탄창 3개를 미친 듯이 쏴댔다. 우리가 무사히 돌아오자 다들 활짝 웃었다. 누구도 살아오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 ▲ 빈스 코트니(오른쪽)씨와 한국인 부인.
◆한국인 짐꾼들과 하나가 되어
캐나다군 1개 대대마다 100명가량의 한국인 짐꾼이 배치됐다. 그들은 탄약과 물자를 날라주며 우리를 보조했다. 모두가 헌신적으로 일했다. 15살부터 65살까지 다양했다. 그들은 무장하지 않았지만 우리와 함께 싸웠다. 짐꾼들은 우리가 심각한 부상을 입는 걸 봤고, 우리 동료가 죽으면 시신을 함께 날랐다. 그들이 전사하면 역시 우리가 묻어줬다. 서로 같은 신념을 갖게 됐고 캐나다인과 한국인이 하나가 된 작은 사회를 만들었다.
◆계속되는 인연
1960년대에 기자가 되면서 생활이 안정됐다. 1970년대부터 20년간은 미국 에너지회사, 유럽 컨설팅 회사에 근무해 부사장까지 승진했고 적당히 부(富)를 쌓았다.
1995년에 모든 일을 접었다. 한국과 캐나다를 잇는 '비공식적 외교관'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40년 넘게 나를 부르고 있던 내 마음속 '그 어떤 것'에 굴복한 것이다. 옛 전쟁터를 찾아 6·25전쟁 참전기를 다룬 책 두 권을 냈다. 1998년에는 한국 여성과 결혼했고, 2001년에는 부산 UN기념공원에 캐나다 전몰용사 기념비 세우는 일을 도맡았다.
매년 11월 11일(1차대전 종전일) 6·25전쟁 참전 생존 전우들이 모인다. 나의 제안으로 모두 UN기념공원이 있는 부산을 향해 머리를 숙여 참배한다. 전우들은 한국의 엄청난 발전과 한국인 대부분이 대학 교육을 받는다는 점을 자랑스러워 한다.
토론토 교외에 있는 우리 집 정원에 무궁화 나무 두 그루를 심었다. 그 꽃을 보면 어린 한국 학생들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며 애국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한국어를 잘 모르지만 나라를 사랑한다는 애국가의 숭고한 의미는 잘 꿰고 있다.
나는 어느새 늙고 병약해졌다. 그러나 내일 당장 한국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58년 전 그 선택을 반복할 것이다.
◆특별취재팀
장일현 기자 ihjang@chosun.com
허윤희 기자 ostinato@chosun.com
손진석 기자 aura@chosun.com
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양모듬 기자 modyssey@chosun.com
양승식 기자 yangsshik@chosun.com